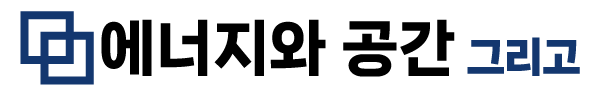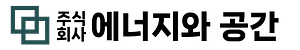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등록 2018.06.04 08:56:54
북한 투자 1순위 강력한 후보, 재생에너지
한반도가 평화롭다. 핵으로 싸늘했던 분위기가 지나갔다. 남북 경제협력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자연스레 국내 기업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업계는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전력이 고프다.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선, 철도와 SOC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전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업계는 북한 전력 해결 방법을 재생에너지에서 찾았다. 재생에너지가 남북 화합을 이끄는 전서구(傳書鳩)가 되었다.

북한 움직임에 들썩이는 재생에너지 시장
‘타노스가 한반도를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NASA가 제공한 한반도 야간 인공사진을 보면 타노스 짓이 분명하다. 사진에선 남과 북이 선명하게 갈린다. 남한에는 무수히 많은 빛이 자리하고 있어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하지만, 북한은 암흑투성이다. 프랑스 욥세르바데르는 이 사진 속 평양을 보고 “마치 검은 바닷속에 깜박이는 작은 섬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만성 전력난을 앓고 있다. 사태가 심각하다. 2016년 기준 남과 북의 전력설비 격차는 14배다. 남한에서 모든 발전소를 가동해 1시간 동안 10만 5,866MW 전력을 만들 때 북한은 고작 7,661MW를 생산한다. 북한에 국내 연간 발전량의 1%도 안 되는 3.87kWh 전력을 공급하면 북한 경제성장률 1%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1990년대부터 퇴보하기 시작했다. 자연재해와 경제난의 영향이 컸다. 남과 북의 관계가 호전되고 경제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남한에서 지원하는 교육과 산업, 농업 시설이 전력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경제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선 북한 전력공급이 필수다. 이 역할은 국내 에너지 업계가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 업계 입장에서 북한은 기회의 땅이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들썩이고 있다. 자금 소요가 적은 재생에너지는 북한 전력난을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퍼시픽파이오는 하장2풍력발전의 주식 26만 주(지분율 52%)를 16억 5,000만 원에, 대한태양광발전 주식 8만 4,000주(지분율 99%)를 27억 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퍼시픽파이오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에너지 사업이다”라며 “화력발전용 바이오 중유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에 재생에너지로 손을 뻗는 기업은 또 있다. 의료정밀기기 업체인 인트로메딕은 최근 150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트로메딕은 경상북도 영덕군, LS산전, 대명지엔, 한국동서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 신재생에너지 및 팜그리드 사업을 추진했다. 게임회사인 와이디온라인도 자회사 ‘와이디파워’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남북 경제협력 분위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쏟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북한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쫓는 기업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에너지 현 상황
북한은 에너지 대부분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한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해 사용하는 남한과는 대조된다. 대북 봉쇄정책 탓에 북한은 에너지를 수입하기 힘들었다. 경제난 탓에 수입할 자금도 부족했다. 북한이 만성 전력난을 앓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진 = NASA>
북한은 스스로라도 전력을 만들어야 했다. 처음 북한이 찾은 답은 석탄이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석탄을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 1차 에너지공급의 63%가 석탄이었다. 하지만 석탄이 한정된 자원이다. 갈수록 사용할 양은 줄어들었고, 가동 중인 설비도 늙어갔다. 북한은 다른 방안을 찾았다. 재생에너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풍력, 지열, 태양광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신년사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이용해 긴장한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5월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늘리며 자연에네르기의 이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재생에너지 중 수력에 강점을 보였다. 북한 발전설비용량 7,600MW 중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5,000MW가 넘었다. 여기서 가능성을 봤을까. 북한은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모양새다. 북한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UN에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에 따르면, 북한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여 계통 연계형 태양광 1,000MW, 서해안 해상풍력 500MW, 육상풍력 500MW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한 연구자는 “대북제재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면 북한 에너지시스템 개선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큰 만큼, 태양광과 수력, 지열 에너지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다. 어쩌면 북한은 도시 전체가 스마트 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전력공급의 Key 재생에너지, 장애물은?
북한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없더라도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 전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북한처럼 전력인프라가 열악한 경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를 짓기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형성하는 게 훨씬 빠르다. 마이크로그리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단방향 구성이 아니라, 소비자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각 가정과 시설의 잉여 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끔 되어 있어 지금의 북한 시스템과도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북한에 마이크로그리드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대표적인 문제가 자금이다.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설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남한에서 북한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마저도 정치 문제와 얽매인다. 북한이 투자 비용만 받고 다시금 문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북한 전역을 재생에너지로 커버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 급한 불은 재생에너지로 끌 수 있어도 북한에 공장과 여러 산업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결국엔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진 = 김동원 기자>

<사진 = 김동원 기자>
북한에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현명한 방법
북한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판문점에 찾아왔고, 손을 내밀었다. 남한도 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재생에너지가 이어갈 수 있다. 북한 전력공급 필요성에 남북한이 공감하고 있고, 서로에게 이득도 있다. 남은 과제는 현명하게 북한에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0년간 단절됐던 교류를 재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란 특수한 성향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곧바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기보다 북한과 오랜 협력 경제협력이 있는 민간 NGO와 공공부문이 우선 나서 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개시하는 게 양측 간 신뢰를 쌓고 본격적인 경협으로 확대하기 앞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지역의 장기적인 에너지 개발계획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에너지를 생산·공급을 시작하는 시기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수급계획이 세우면 이후 에너지구조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초기 조건이 재생에너지 공급에 불리한 여건으로 조성되면 이후 경로를 변경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다.